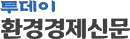최근 국제 연구와 국내 의료계 분석에서 생활습관이 뇌 노화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칠레 아돌포 이바녜스대 공동 연구진은 유럽 27개국 50세 이상 8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2개 국어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모국어만 쓰는 사람보다 뇌 노화가 현저히 늦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종합해 ‘생체 행동 나이’를 산출했다. 그 결과 모국어만 쓰는 사람은 노화 가속 위험이 2.1배 높았고, 외국어를 하나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그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언어를 많이 구사할수록 효과는 더 컸다.
전문가들은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과정이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 신경망의 연결성을 높이고, 노화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제이슨 로스먼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는 “다중 언어 사용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공중보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뇌의 피로를 높이고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질을 떨어뜨려 뇌의 회복 과정을 방해한다. 수면 중에는 베타아밀로이드 등 노폐물이 제거되지만,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오히려 뇌 손상이 누적된다.
영국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이 7시간 수면자보다 치매 위험이 약 30%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의 전두엽과 해마 세포를 손상시킨다. 김지현 수원나누리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과도한 디지털 자극은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가속화시킨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람과의 교류나 가벼운 운동으로 뇌에 ‘휴식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혈류를 개선하며, 사회적 교류와 외국어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뇌의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