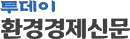국내 당뇨병 환자 중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혈당 관리의 핵심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1년에 한 번도 받지 않거나 단 1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 2~4회 정기검사를 권고하는 진료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여, 환자들의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당뇨병 환자 439만 8천 명 가운데 123만 6천 명(28.1%)이 1년 동안 검사를 0회 또는 1회만 했다.

이 가운데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40만 2천 명, 단 한 번 받은 환자는 83만 4천 명이었다. 반대로 권고 수준에 맞춰 연 2~4회 검사를 받은 환자는 272만 1천 명(61.8%)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불필요하게 검사를 자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 5회 이상 검사를 시행한 ‘과다검사군’ 환자는 44만 2천 명(10.0%)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데도 잦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비용만 늘릴 뿐, 혈당 관리의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환자가 평소 얼마나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식단을 관리했는지, 장기적으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질환, 신장손상 등 만성 합병증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어, 당뇨병 관리의 기본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 관리 현장은 이상적인 기준과 거리가 있었다. 공단의 추가 분석 결과, 1년간 한 곳의 의원만 이용한 환자 242만 7천 명 가운데 35.8%(86만 9천 명)가 연 1회 이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반대로 특정 의원에서는 100여 명의 환자에게 평균 7회에 달하는 과다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기관마다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의미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오승환 교수는 “연 1회 이하의 검사는 명백히 과소진료”라며 “검사 횟수가 적으면 실제 혈당 조절이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도 꾸준히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뇨병은 환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료 패턴 또한 관리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과다·과소진료를 모두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진료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들이 3개월 간격으로 꾸준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당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진과 함께 목표 수치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한 검사 횟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자가관리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합병증 예방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다.